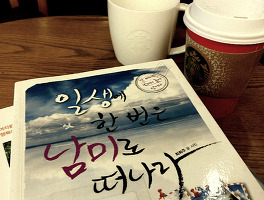■ 본문 중에서
# 달에울다
사과나무가 자는 밤에는 나도 잔다. 사과나무와 함께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움직이지 않으리라. 비록 야에코가 마을을 떠난다 해도 나는 기필코 남겠다. 아니다. 그때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야에코 역시 어머니와 함께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 38p.
야에코 위로 폭염이 소용돌이쳤다.
그 위에는 타서 눌은 하늘이 있고, 조금 더 위에는 타다 문드러진 태양이 눌어붙어 있다. 이 산 저 산에서 요란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폭풍우 같은 매미 소리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괴성을 지르던 야에코가 벌채된 나무처럼 무너지며 내 위를 덮쳤다. - 54~55p.
분명 나는 비정상이다.
나 스스로도 인정한다. 남들은 줄곧 독신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상한 게 아닐까? 10년 사이에 마을 사람들은 한층 더 나쁘게 변했다. 이제 그들은 농사꾼도 월급쟁이도 아니다. 그저 애매한 상태로 질질 후퇴하고 있다. 동정이나 변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인상이 나빠졌고 눈동자는 빛을 잃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까지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 96p.
# 조롱(鳥籠)을 높이 매달고
"개도 정신병에 걸리나요?"
"그럼." 수의사는 나를 외면하며 말했다. "살아 있는 것은 모조리 미치게 마련이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조금씩은 이상하니까." 그는 구부러진 주삿바늘을 펴면서 덧붙였다. "이상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겠어." - 124p.
나는 파도가 닿지 않는 모래밭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검둥이가 옆에 와서 엎드렸다. 따스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오후의 따스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따스한 허무가 나를 감쌌다. 지금까지 살아온 41년하고도 몇 개월 동안 쌓였던 피곤이 어느새 불쾌하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급속히 느긋해져갔다. 전신의 힘이 엄지발가락 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드러누워야 하는 쪽은 검둥이가 아니라 나인지도 몰랐다.
"이제 아등바등 사는 건 그만두자." 내가 말했다. "당분간 이곳에 정착하지 않을래?"
"거 좋은 생각이군." 또 하나의 내가 말했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누구나 정상이지."
지금 내게는 밑바닥 없는 깊은 휴식이 필요하다. 천천히 몸을 쉬어야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 나름대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편인지도 모른다. - 149~150p.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가능하면 내 자신에게서도 멀어지고 싶었다. 그렇다고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차를 몰아 바다로 뛰어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실천했을 것이다. 이제 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다. 나는 틀림없이 행복의 문턱에 서 있다.
"거짓말 마!" 또 하나의 내가 말했다.
"거짓말 아냐." 내가 말했다. - 172p.
나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순수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조잡하고,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자유롭게, 꿈꾸는 듯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동안 이렇게까지 편안한 기분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간신히 식욕만 남았으며 욕망의 대부분은 흐릿해져갔다. 다른 일들은 아무래도 상관 없었다. - 222p.
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이 행복한 듯도 했다. 누구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된다.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단순한 이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좋았을걸." 또 하나의 내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말했다. "이제부턴 그래야겠어." - 261p.
<달에 울다>
마루야마 겐지 지음, 한성례 옮김
자음과 모음, 2015
 |
|
'암묵지 > 추억의 책장 · 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생에 한 번은 남미로 떠나라] 유럽은 맨 메이드 Man made, 남미는 갓 메이드 God made ! (0) | 2015.12.12 |
|---|---|
|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박경리 유고시집 (0) | 2015.11.01 |
| [칼럼니스트로 먹고살기]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쓰며 살고 싶어요 (0) | 2015.10.25 |
| [Good to Great and the Social Sectors]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0) | 2015.10.03 |
| [백인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말하지 말라] 더 진실한 아프리카의 역사 이야기 (0) | 2015.08.26 |